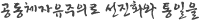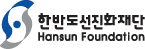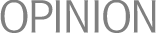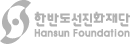지난 2019년 정부가 내세운 ‘핀셋 증세’라는 이름으로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한 일이 있었다. 세율과 달리 공시가격 조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해 서울 연남동의 한 단독주택 소유자는 2018년 15억원이었던 공시가격이 40억원으로 오른다는 사전 통지를 받았다. 일 년 사이에 내 집 값이 그렇게 뛰었단 말인가. 소유주가 강하게 반발하자 정책당국은 단 열흘 만에 공시가격을 30억원으로 깎아서 확정했다. ‘고무줄 공시가격’이다. 명쾌한 기준을 갖고 만들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에 ‘정책적으로’ 개입한 결과이다. 부동산가격공시법에는 분명 공시가격이 시장수준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법률 위반’이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피하려 2020년 4월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조문을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삽입했다. 그 결과 부동산가격공시법은 ‘시장수준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 공시가격’이라고 1조에 규정하고, 26조의 2에는 ‘시세반영률’을 적용한 것이 공시가격이라는 자기 모순적 구조를 갖게 됐다.
정부의 개입은 1989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때부터 있던 ‘관행’이다. 당시 정부도 법률에 따라 시장수준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납세자의 반발이 걱정됐다. 재산세로 직결되는 공시가격이 너무 높으면 반발이 정부로 향할 것은 불 보듯 뻔했다. 그 후 공시가격은 암묵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작성됐다.
누더기 법 개정에 공시가격 개념 불일치
물론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시세를 100% 반영한 ‘주택산정가격’과 ‘토지의 세평가격(世評價格·감정평가 가격)’자료가 들어있다. 공개하지 않을 뿐이다. 2020년 11월 공시가격 로드맵이 발표될 때 시세반영률이 69%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것도 평균치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다르고, 유형별로 다르고, 심지어 주택마다 다르다.
공시가격은 정치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다. 공시가격의 근간이 되는 ‘적정가격’의 해석을 사실상 정부 재량에 맡겼기 때문이다. 법률에 ‘공시가격은 개념상 적정가격인데 시장을 반영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적정가격은 정책목적가격이라 시장수준과 괴리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가 퍼져나갔다.
이를 인정하면 공시가격은 계속해서 정부의 의중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납세자에게 유화책을 쓴다면 경기침체를 이유로 공시가격을 낮출 수 있고, 이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겠다면 공시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장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은 사라지고, 정부가 올리는 청기·백기만을 쳐다보게 된다. 당연히 공시가격을 제대로 만드는 전문성도 사라지고 만다.
현행 부동산가격공시법 제1조는 공시가격에 대해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5항은 ‘적정가격’을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정의한다. 이를 보면 정부가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가격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이 적정가격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 미국에선 법령 등에 공시가격의 근원이 되는 시장가치(Market Value)를 상세하게 서술한다. 핵심은 시장가치는 완전경쟁시장의 균형가격이므로 호황기의 거품 가격으로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장가치는 실거래가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에만 의존해서 만들면 최근에 들려오는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신고가’ 소식이 내년 공시가격을 결정할 것이다. 서울 전체가 아직은 침체 상태이고, 내 집은 오르지 않았는데 특이한 거래 하나 때문에 공시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조세 형평성의 기본은 납세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미국에선 거래가 많은 지역의 납세자와 거래가 없는 지역의 납세자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미국 대부분의 주는 감정평가 방식을 채택한다.
미국은 공시가격에 감정평가 기법 사용
한국은 토지는 공시지가 고시를 위해 감정평가를 하지만, 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거래 자료 위주로 산정을 한다. 감정평가는 전문 서비스라 수수료가 비싸서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국내 토지는 3900만 필지이고 주택은 1869만 가구이다. 숫자가 많은 토지에는 감정평가, 그보다 적은 주택에는 비용 문제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오히려 주택 공시가격의 비감정평가 산정 수수료가 더 비싼 것이 현실이다. 감정평가를 하자는 것은 해당 업계를 대변하기 위함이 아니다.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이제라도 ‘정책목적가격’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장수준을 제대로 포착하고 그것을 그대로 공표해야 한다. 공시가격은 시장가치여야 한다. 시세를 69% 반영하다가 100%가 되면 세금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걱정에 뒷걸음질해서는 안 된다. 세금 부담이 걱정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의 60%에서 30%로 낮추면 된다. 미국 캔자스주처럼 11.5%로 해도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국회에서 그 범위를 정한다. 논쟁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회에 맡기되, 공시가격은 시장수준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3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이 고무줄 공시가격 문제를 그대로 둔다면, ‘널뛰는 공시가격’으로 우리 사회가 겪었던 고통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공시가격이 정책목적가격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 ‘시장수준을 반영하는 가격’이라고 확정하자. 그것이 공시가격을 정치 논리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방법이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2444 | [문화일보] 21대 ‘최악 국회’가 남긴 4대 폐해 | 24-05-31 |
| 2443 | [한국일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개혁 논제 아니다 | 24-05-29 |
| 2442 | [이데일리] 공익법인에 대한 발상의 전환 | 24-05-28 |
| 2441 | [한국경제] 중국, 기술 베끼는 나라?…"이제는 현실 받아들여야" | 24-05-24 |
| 2440 | [문화일보] ‘쿠팡 PB 조사’와 국내 업체 역차별 우려 | 24-05-24 |
| 2439 | [중앙일보] 다시 길 잃은 보수, 재건 가능할까? | 24-05-23 |
| 2438 | [문화일보] 이재명 ‘일극 정당’과 정치 노예의 길 | 24-05-17 |
| 2437 | [중앙일보] 15억 집이 1년 만에 40억으로?…공시가격을 망치는 이들 | 24-05-16 |
| 2436 | [노동법률] 총선 이후 노동개혁 입법의 쟁점과 과제 | 24-05-13 |
| 2435 | [한국경제] '중국판 밸류업' 국9조, 성공할 수 있을까 | 24-05-09 |
| 2434 | [아시아투데이] 4·10 총선이 소환한 슘페터와 하이에크의 경고 | 24-05-07 |
| 2433 | [문화일보] 깜짝 성장 명암과 물가 안정 중요성 | 24-05-02 |
| 2432 | [문화일보] 尹·李회담 지속 관건은 ‘자제와 존중’ | 24-04-30 |
| 2431 | [아시아투데이] 북한의 사이버 공작 등 영향력 확대에 대비해야 | 24-04-30 |
| 2430 | [한국경제] 시진핑이 강조하는 '신질 생산력' 과연 성공할까? | 24-04-25 |
| 2429 | [문화일보] 민심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 24-04-23 |
| 2428 | [문화일보] 위헌 소지 큰 ‘중처法’과 헌재의 책무 | 24-04-23 |
| 2427 | [한국경제] 적화 통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 24-04-22 |
| 2426 | [아시아투데이] 우수한 ‘지배구조’ 가늠할 ‘기준’ 과연 타당한가? | 24-04-19 |
| 2425 | [파이낸셜투데이] 영수 회담을 통한 ‘민생 협치’를 기대한다 | 24-04-18 |